Jun Kyoung Rin’s novel, ‘An angel stays here’ 천사는 여기 머문다
Photos by MUNHAKDONGNE publishing corp
A book written by Jun Kyoung Rin consists of nine short stories. It seems like there are different stories but those stories are from the same root, woman’s life and dreariness.
There is an island called woman and also an oasis called love. Animals which are thirsty stop by for drinking water. Even fragile flowers and grass also gather near the oasis to survive. The hot sun and cold moon turn around the oasis to look at their reflection. The island feels proud of that crowded.
However, as time goes by, oasis loses its role like miracle. The oasis dries up and nothing comes to it. The island is desolate. it misses the hot sun and the cold moon but it can’t be helped. The island cannot help remembering and reviving old memories about its oasis like a dream.
Reading these stories, I feel like I reach a small island which is lonely and bleak but has remains which was beautiful once. Characters in stories are all women. And I can say they have an unfortunate destiny. However, a feast of symbolic images and surprisingly delicate expressions of writer make me rather feel jealous of character’s tough lives.
If you feel lonely, it’s good way to join this trip toward this small island. Some parts in this book can comfort us fully because there are sentences as warm as we can dump our very private feelings on it.

Jun Kyoung Rin’s novel, ‘An angel stays here’
전경린의 단편소설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되었다. 각자의 사연을 품은 주인공들의 삶을 뻔뻔하게 기웃거려 보는 여정이었는데, 종착지에 다다르고 보니 결국엔 뿌리가 같은 가지들이었다.
‘여자’라는 섬이 있다. 그 섬에는 ‘사랑’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다. 목이 마른 동물들은 오아시스에 들러 목을 축이고, 연약한 꽃과 풀들마저도 연명하기 위해 오아시스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뜨거운 해도, 얼음처럼 차가운 달도 그들의 자태를 뽐내기 위해 따갑고, 시리도록 오아시스 주변을 돌며 자신들을 비추어 보았다. 섬은 북적거리는 자신의 오아시스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아시스는 더 이상 그 이름이 상징하는 기적 같은 역할을 잃어갔다. 마를 것 같지 않던 물이 말라갔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오아시스 곁에 머물지 않았다. 섬은 적막했다. 뜨거웠던 태양도, 얼음처럼 차가웠던 달도 그리웠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저 한 때, 자신의 전부였던 오아시스를 다시는 품에 안을 수 없는 꿈처럼 추억하고 기억하는 수밖에 없었다.
9개의 단편소설들을 조각조각 읽어가다 보니, 하나의 작은 섬에 온 것 같았다. 외롭고 적막하지만 과거의 아름다웠던 잔해들이 쓸쓸하게 남아있는. 소설의 주인공은 모두 여자들이며, 어찌 보면 다들 팔자가 왜 저럴까, 싶을 정도다. 하지만 작가 전경린 특유의 상징적인 이미지들의 향연과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표현들은 주인공들의 고달픈 인생마저도 질투 나게 한다.
‘어느 날,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말이예요. 당신이나 내가 세상과 작별한다면, 우리, 흘러다니는 소문으로 그 소식을 알리지 말아요. 예의를 갖춘 정식 부고를 주고받고 싶어요. (중략) 우리가 낙엽처럼 가벼워져서 한 걸음으로 훌쩍 공기 속으로 넘어가게 될 때요. 이것이,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예요. (중략) 이 편지도 다른 편지들처럼, 수신자인 당신과는 무관하게 내 서랍 속에 수납되겠지요. 늘 그랬듯이,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되기를 바라요’.
그녀의 표현을 빌려 ‘낡은 앨범 한 권이 매캐한 먼지 냄새를 피우며 펄럭’이는 심정의 당신이라면, 이 작고 외로운 섬으로의 여정에 동참해 보면 어떨까. 가끔 소설의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사적인 감정을 무책임하게 떠맡겨도 좋다. 전경린의 마술 같은 언어들은 우리를 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Contributor, Ha Young Kyoung
As a freelance journalist, she majored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University. Based on unique sensitive, she writes about several sections of Korea public culture.
대학에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한 프리랜서 기자 하영경. 문학적인 감성으로 바라본 다양한 주제의 대중문화 이야기를 솔직담백한 그녀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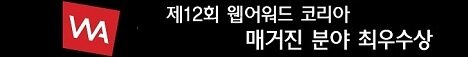








Comments are closed